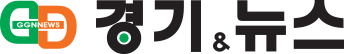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하늘은 높고 자연은 수줍게 물든다. 그런데 가을을 살찌우는 건 들녘의 곡식만이 아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은 아닌 듯 사람의 마음을 매혹한다. 못 이기는 척 그 고운 빛깔과 어울려 한철을 누릴 일이다.
설악산 단풍이 10월 19일을 전후해 절정에 올랐다. 뒤를 이어 10월 말은 지리산, 치악산, 속리산이 기다린다. 11월 초에는 내장산, 두륜산 등이 피날레를 장식할 것이다. 그렇게 올가을도 지나갈 것이다. 첫 단풍은 산 정상부의 20%가 물들었다는 뜻이고,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말은 산 전체의 80%까지 내려왔다는 의미다. 그러니 단풍이 일상의 발끝에 닿을 때쯤, 가을은 이미 정상부터 저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삶을 일으켜 세우는 여유는 발끝에서 자연스레 생겨나지 않는다. 억지로 내디딘 한 걸음이 때로는 가쁜 삶의 양분이다.
부담 없는 가을 걸음을 하려면 전북 고창이 좋다. 대부분 인근의 내장산으로 향하지만 고창의 단풍도 그에 못지않다. 무엇보다 장성군과 경계한 고창군 고수면에 문수사가 있다. 단풍이 들 때면 아는 사람만 찾아드는 고즈넉한 산사다. 지난 2005년 문수사 단풍나무 숲이 천연기념물 제463호로 지정되며 소문이 났다. 단풍나무 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건 처음이다. 누구인들 천연기념물 단풍나무 숲에 호기심이 일지 않을까. 10년 사이에 찾아드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그럼에도 문수사가 낯설다면 아직은 숨은 여행지라 할 만하겠다. 이곳에선 내장산에 비해 조금은 느긋하게 단풍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문수사는 고창담양고속도로 남고창나들목을 이용한다. 조산저수지를 지나서 은사리 신기계곡 방면으로 방향을 잡는다. 조금씩 시골스러운 풍경이 열린다. 신기마을에서 다시 문수사 쪽으로 우회전하면 차선은 사라지고 외길 도로다. 약 700m를 더 들어가니 청량산문수사라 적힌 일주문이 반긴다. 그 앞이 문수사 주차장이다.
 |
| 664년 자장율사가 세운 문수사는 소소하고 은근하다. |
청량산(淸凉山)은 고창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장성 사람들에게는 축령산이다. 문수사 동쪽 고개 너머가 편백나무 숲으로 유명한 축령산휴양림이다. 문수사의 이름을 따 문수산이라고도 한다. 문수사는 644년 자장율사가 세웠다. 그가 문수보살을 만나 깨달음을 얻은 당나라의 청량산과 비슷하다 해 부르게 된 청량산이란 이름 또한 문수사와 무관하지 않다.
단풍은 일주문에서 경내로 들어서는 진입로부터 짙다. 약 400m 거리의 아스팔트길을 부드럽게 굽이치며 들어서는데, 그 검은 도로가 금세 잊힌다. 길가로 가득한 단풍의 열기 때문이다. 단풍나무를 필두로 고로쇠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들이 저마다 다른 색을 시샘하며 경쟁하듯 물들었다. 산기슭만 차지하고 있기가 못내 아쉬웠나, 몇몇 그루는 아예 길가로 긴 가지를 내밀어 단풍 낙엽을 떨어뜨린다. 어지간한 인내로는 그 경치를 이겨낼 재간이 없다. 걸음을 멈추고 휴대폰 사진으로 가을을 담는 건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그 절정은 관리사무소를 지나 왼쪽으로 길을 오를 때부터다. 천연기념물을 알리는 표지판에는 일대에 ‘100년에서 400년으로 추정되는 단풍나무 500여 그루가 자생한다’고 적혔다. ‘나무의 크기는 직경 30~80cm, 수고는 10~15m’라 덧붙였다. 숫자에 압도당하지 않는 건 지나온 짧은 길의 단풍만으로도 가을 감성으로 잔뜩 들뜬 덕이다. 이어지는 풍경 역시 다르지 않다. 단풍이 무르익은 길가로 계곡이 어우러진다. 물길 위에는 단풍이 무리지어 떠다닌다. 바위 위에 쭈그려 앉아 모양을 살피노라니, 별들이 밤새 무리지어 떨어진 양하다. 별의 색은 단풍의 빛깔이라던가.
 |
| 일주문에서 경내로 이르는 길가 계곡 물길 위에 마치 별 같은 단풍잎이 무리지어 떠 다닌다. |
문수사 또한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곧장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높게 쌓은 축대 위에서 언뜻 그림자 같은 처마만 내민다. 절집은 축대 아래에서 기대하던 바에 비하면 소박하다. 동쪽은 대웅전과 문수전이 차례로 자리한다. 대웅전과 문수전은 전북 유형문화재로 문수사를 대표하는 건물이다. 하지만 모습을 뽐내지 않는다. 소소하며 은근하다. 북쪽엔 금륜전과 응향각, 산신각이 한 지붕 아래 들어 있다. 금륜전 앞에는 문수보살의 지혜를 닮은 용지천 약수가 사시사철 흐른다. 마른 목을 축이며 삶의 지혜 한 모금 간구한다. 문수사까지 이르는 여정이 화려한 단풍의 설렘을 안겼다면, 문수사는 그 여운을 음미하며 마음에 새기기에 알맞다. 규모로 압도하지 않으며 시간으로 짓누르지 않는다. 무엇보다 들뜬 마음을 추스른 후에야 돌아가는 길가의 단풍을 한 번 더 품어 안을 수 있다.
<정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