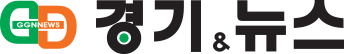배후 개입 의혹, 자금 출처 의혹, 수사 은폐 의혹 등 사건의 모든 의문에 대해 특검은 혐의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특검의 이런 결론을 그대로 믿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아니 7개월여가 지나는 동안 이 사건은 벌써 국민들의 관심권 밖으로 멀어졌다고 할 수도 있다.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기보다 그러려니 할 뿐이다. 그 사이 또 얼마나 많은 권력형 비리, 공직자 연루 위법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때마다 속시원한 수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던가 말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가 있었고,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들 역시 검찰의 수사결과를 못 믿겠다는 여론의 질타 속에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주장에는 디도스 특검에서 보듯, 특검을 한들 뭐가 더 밝혀지겠느냐는 체념이 이미 배어 있다. 특검 무용론이다.
1999년 한국에 특검이 최초로 도입된 후 10차례의 특검이 있었다. 옷로비 사건, 이용호 게이트, 대북 송금 사건, 삼성 비자금 사건, BBK 사건 등 세상을 뒤흔들었던 의혹사건마다 특검이 구성돼 수사에 나섰지만 의혹이 명쾌하게 규명되고 관련자가 처벌된 것은 이용호 게이트 등 겨우 한두 사건에 불과하다. 미진한 특검 수사는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특검 제도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도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특검이 본격적으로 도입됐지만 이후 실효성에 대한 의문 및 예산 낭비, 정파적 이용 논란 등으로 결국 1999년 르윈스키 스캔들 특검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한국의 특검도 미국과 비슷한 길을 걸을 것 같다. 디도스 특검의 경우 3개월 동안 100여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하고 20억원의 돈을 썼지만 보잘 것 없는 수사 결과로 특검 무용론을 또다시 자초했다. 한국의 특검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구조상 결코 현존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사실 그것이 특검 무용론이 반복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구조적 문제다. 특검 대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상설기구로 두자는 법조계의 주장이 계속 나오는 것은 이같은 한계가 그간의 특검 운용 경험에서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검 무용론에서 나타나듯 정치ㆍ경제적 거대 비리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무관심 내지 체념 상태로까지 빠지고 있는 한편으로, 비리를 단죄하고 견제해야 할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마저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법 현실이다.
7월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후임 후보자들이 지난 5일 발표되고 열흘 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19대 국회는 개원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처리가 법적 데드라인인 7월4일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난망이다. 정치권과 국회의 파행으로 대법관 4명이 궐석 상태가 돼 대법원 업무의 공백이 생기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도 김용덕, 박보영 2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돼 42일 동안 대법원 업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지만, 전체 13명 중 4명의 대법관이 교체되는 이번의 경우는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대법원은 "사실상 대법원의 재판기능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검, 대법원까지 정치적 타산과 정쟁 때문에 비틀거리는 현실에서 거대 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똬리를 틀 것이다.